허조이묘
原理氣˚
太虛湛然無形 號之曰先天 其大無外 其先無始 其來不可究 其湛
然虛靜 氣˚ 之原也 彌漫無外之遠 逼塞充實 無有空闕 無一毫可容
間也 然挹之則虛 執之則無 然而却實 不得謂之無也 到此田地
無聲可耳 無臭可接 千聖不下語 周張引不發 邵翁不得下一字處
也 摭聖賢之語 泝而原之 易所謂寂然不動 庸所謂誠者自成 語其
湛然之體 曰一氣˚ 語其混然之周 曰太一 濂溪於此不奈何 只消下
語曰無極而太極 是則先天 不其奇乎 奇乎奇 不其妙乎 妙乎妙
倏爾躍 忽爾闢 孰使之乎 自能爾也 亦自不得不爾 是謂理之時也
易所謂感而遂通 庸所謂道自道 周所謂太極動而生陽者也 不能
無動靜 無闔闢 其何故哉 機自爾也 旣曰一氣˚ 一自含二 旣曰太
一 一便涵二 一不得不生二 二自能生克 生則克 克則生 氣˚ 之自
微 以至鼓盪 其生克使之也 一生二 二者何謂也 陰陽也 動靜也
亦曰 坎離也一者 何謂也 陰陽之始 坎離之體 湛然爲一者也 一
氣˚之分 爲陰陽 陽極其鼓而爲天 陰極其聚而爲地 陽鼓之極 結其
精者爲日 陰聚之極 結其精者爲月 餘精之散 爲星辰 其在地 爲
水火焉 是謂之後天 乃用事者也 天運其氣˚ 一主乎動而圜轉不息
地凝其形 一主乎靜而榷在中間 氣˚ 之性動 騰上者也 形之質重 墜
下者也 氣˚ 包形外 形載氣˚ 中 騰上墜下之相停 是則懸於太虛之中
而不上不下 左右圜轉 亘古今而不墜者也 邵所謂天依形 地附氣˚
自相依附者 依附之機 其妙矣乎 風族飛載皆此理也
補充
先生又曰「虛者 氣之淵也」又曰「一非數也 數之體也」又曰
「理之一其虛 氣之一其粗 合之則妙乎妙」又曰 易曰「不疾而
速 不行而至」氣無乎不在 何所疾哉 氣無乎不到 何所行哉 氣之
湛然無形之妙曰神 旣曰氣 便有粗涉於迹 神不囿於粗迹 果何所
方哉 何所測哉 語其所以曰理 語其所以妙曰神 語其自然眞實者
曰誠 語其能躍以流行曰道 總以無不具曰太極 動靜之不能不相
禪 而用事之機自爾 所謂一陰一陽之謂道 是也 又曰 程․張謂
「天大無外」卽太虛無外者也 知太虛爲一 則知餘皆非一者也
邵子曰 或謂「天地之外 別有天地萬物 異乎此天地萬物 吾不得
以知之也 非惟吾不得以知之 聖人亦不得以知之也」
邵子此語 當更致思
又曰 禪家云「空生大覺中 如海一漚發 有曰眞空頑空
者 非知天大無外 非知虛卽氣者也 空生眞頑之云 非知理氣之所
以爲理氣者也 安得謂之知性 又安得謂之知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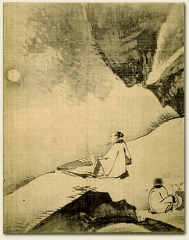
이理와 기氣의 근원을 추구함
태허太虛의 맑고 형체가 없는 것, 이를 일컬어 선천先天이라 한다. 그 크기는 한이 없고, 그에 앞서는 아무런 시작도 없었으며, 그 유래는 추궁할 수도 없다. 그 맑게 비고 고요한 것이 기氣의 근원이다. 널리 퍼져 있어[彌漫] 한계의 멀고 가까움이 없으며, 꽉 차 있어 비거나 빠진 데가 없으니, 한 가닥의 터럭이 용납될 남은 공간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손으로 떠 봐도 텅 비고, 그것을 잡아 봐도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그것은 차 있는 것이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경지에 이르면 귀에 담을 소리가 없으며 맡을 냄새도 없으니, 여러 성인들도 이에 관한 말이 없었고, 주돈이周敦頤와 장재張載도 끄집어내어 드러내지 못하였으며, 소옹邵雍도 이에 관하여 한 글자도 쓰지 못한 처지인 것이다. 성현들의 말씀을 주워 모아 거슬러 올라가 그 근원을 캐 보면 ꡔ역경ꡕ에서 말한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것’과 ꡔ중용ꡕ에서 말한 ‘정성된 자는 스스로 이룩되는 것’이 그것이다.
그 맑은 본체를 말로 표현하여 일기一氣라 하고, 그 혼연混然한 둘레를 말로 표현하여 태일太一이라 한다. 주돈이도 이에 대하여는 어찌할 수 없어서 다만 무극無極이면서도 태극太極이라 표현하였다. 이러니 선천先天은 기이하지 아니한가? 기이하고 기이하다. 오묘하고 오묘하다. 갑자기 뛰어오르기도 하고 갑자기 열리기도 하였는데,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일까?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스스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니 이것을 이理가 발휘된 때라 한다. ꡔ역경ꡕ에서 말한 ‘느낌이 있으면 마침내 두루 통한다’는 것과 ꡔ중용ꡕ에 서 말한 ‘도道는 스스로 이끌어 나아간다’는 것과 주돈이가 말한 ‘태극太極은 움직이어 양陽을 낳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움직임과 고요함 닫힘과 열림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우주의 기틀이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미 일기一氣라 하였지만 일一은 스스로 이二를 품고 있으며 이미 태일太一이라 하였지만 일一은 곧 이二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一은 이二를 낳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二는 스스로 나거나 극복될[生克] 수 있는 것이다. 낳아질 수 있으면 곧 극복할 수 있게 되고 극복할 수 있으면 곧 낳게 되는 것이다. 기氣의 미세微細함으로부터 진동振動하는 데 이르기까지 모두 그 ‘낳음’과 ‘극복함’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일一이 이二를 낳는데, 이二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음陰과 양陽을 뜻하며, 움직임과 고요함을 뜻하며, 또한 감坎과 이離를 뜻한다. 일一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음과 양의 시작이며 감坎과 이離의 본체本體로서 맑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일기一氣가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고, 양陽의 극極이 진동하여 하늘이 되었으며 음陰의 극이 모여서 땅이 되었다. 양陽이 진동된 끝에 그 정기[精]가 엉킨 것이 해가 되었으며, 음陰이 모여든 끝에 그 정기가 엉킨 것이 달이 되고 나머지 정기가 헝클어져 별들이 되었다. 그것이 땅에 있어서는 물․불이 되었는데, 이것을 후천後天이라 부르며, 곧 자연의 활동이 있게 된 것이다. 하늘은 그 기氣를 운용運用하여 한결같이 움직임을 위주로 하여 빙빙 돌면서 쉬지 않고, 당은 그 형상[形]을 한데 엉기게 하여 한결같이 고요함을 위주로 하여 중간에 꿈적 않고 있다. 기氣의 성질은 움직이어 위로 뛰쳐 올라가는 것이며, 형상[形]의 바탕은 무거워서 아래로 처지는 것이다. 기는 형상 바깥을 사고 있고, 형상은 처지는 게 서로 균형 잡혀 멎어 있게 된다. 이리하여 태허太虛 가운데 매달려 있으면서도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좌우로 빙빙 돌면서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떨어지지 않게 된 것이다. 소옹邵雍이 말한 것같
이 ‘하늘은 형상에 의지하고 땅은 기에 붙어, 자연히 서로 의지하고 붙어 있는 것’인 것이다. 의지하여 붙어 있는 기틀이야 말로 오묘하지 아니한가! 바람의 무리 나는 무리들의 깃[羽]이 형상을 싣고 있는 것도 모두 이 이치로서이다.
보충
서경덕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허공이란 것은 기氣의 연못이다. 일一이라는 수數가 아니요, 수의 본체本體이다. 이理의 일一은 텅빈 것이고, 기氣의 일은 성근 것[粗]인데, 이들을 합치면 오묘하고도 오묘해진다” ꡔ역경ꡕ에 말하기를 “서두르지 아니하여도 빠르고, 가지 않아도 이르게 된다” 하였다 기氣는 있지 아니한 곳이 없으니 무엇 때문에 서두르겠는가? 기는 이르지 아니한 곳이 없으니 어느 곳으로 가겠는가? 기의 맑고 형체가 없는 오묘함을 신령하다[神]고 말한다. 이미 기氣라고 말했으니 곧 거친 것[粗]이 있어 흔적을 지니게 되지만, 신령함은 거친 흔적에 매이지 않으니, 그렇다면 어디에서 형체를 알아보며, 어디에서 재어보겠는가? 그 근거를 표현하여 이理라 하고, 그 오묘한 근거를 표현하여 신령함이라 하며, 그 자연스럽고 진실된 것을 표현하여 정성됨이라 하고, 그 뛰쳐오르면서 두루 둘아다닐 수 있는 것을 표현하여 도道라 하며, 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을 종합하여 태극太極이라고 한다. 움직임과 고요함이 서로 양보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연의 작용의 기틀이 스스로 그렇게 되니, 이른바 ‘일一의 음陰과 일一의 양陽을 도道라 한다’고 말한 것은 이것을 뜻한다. 정호程顥와 장재張載는 말하기를 “하늘은 커서 한이 없다” 하였는데, 곧 ‘태허太虛는 한이 없는 것’이란 뜻이다. 태허太虛가 일一이란 것을 알고 있으니, 곧 나머지는 모두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다.
소옹邵雍은 말하기를 “어떤 이는 하늘과 땅밖에 다른 하늘․땅․만물이 있는데, 이곳 하늘․땅․만물과는 다르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 나만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인聖人도 역시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다”고 하였다. 소옹의 이 말은 마땅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불교에선 말하기를 “공空은 큰 깨달음 가운데서 생기며 바다의 한 물거품[漚]이 생겨나는 것 같은 것” 이라 하였고, 또 참된 허공[眞空]과 둔한 허공[頑空]을 말한 것이 있는데, 이는 하늘은 커서 한이 없는 것임을 알지 못한 것이고, 비어 있는 것은 바로 기氣임을 알지 못한 것이다. 허공이 참된 것과 둔한 것이 생긴다는 말은 이理와 기氣가 이와 기로서 지니는 작용을 알지 못한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그러니 어찌 그들이 본성[性]을 안다고 할 수 있겠으며, 또 어찌 그들이 도道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